빌런 플레이 리스트를 전투복 삼아
셀프 감금. 단출한 일상에 익숙해졌다. 제한된 시간을 인질 삼아 스스로 감금하고 통제하는 삶에 가깝다. 모니터에 얼굴을 박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와이파이를 붙잡은 채 나를 코너로 밀어 넣는다. 시간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할 일의 목록을 지워내는 것보다 깜빡이 없이 밀고 들어온 사안들을 헤쳐내다 보면 별수 없다.
그리하여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는 기피 대상. 도망가자가 반복되는 후렴구가 내 무의식의 숙주를 소환할지 모른다. 백지에서 시작하는 기획서와 제안서에 파묻혀 제대로 꺼 본 적 없는 노트북은 수시로 다운되기 시작했다. 헝클어진 내 전두엽의 실사판이랄까.
잠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노트북과 물아일체 되어있는 삶을 누가 원할까. 허나 그렇게 나를 주저앉혀야만 마감을 맞출 수 있다. 자꾸 유실되는 집중력을 탓하며 애꿎은 플레이리스트만 검색한다. “도망가고 싶어”를 읊조리면서. 애청하는 너튜브 플레이리스트는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지만 덩달아 일의 리듬이 늘어질 수 있어 잔잔한 건 금지. ‘마감 임박 50분 전 폭풍전야 클래식’이나 ‘빌런 몰입 클래식 모음’ 같은 비장하고 격양된 선곡이 주를 이룬다.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은 시간 여행자가 아니었을까. 노마드족, 리모트 워커. 허울만 좋은 21세기 현실 노동자의 뉴런은 24시간 내내 와이파이와 동기화 상태. 스마트폰을 들고 습관적으로 메일함을 검색하다 잠들어 그 자세 그대로 눈 뜬 아침이면 미래 먹거리는 인간의 관절 연구에 걸려있겠다는 확신이 든다. 십 년 뒤엔 리필용 프린트 잉크처럼 셀프 주입할 수 있는 관절 키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함께.
노동요가 되어 버린 음악을 감상했던 시절이 전생 같다. 거대한 진공관 앰프로 둘러싸인 크리스마스의 음악 감상실.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 하던 분만실에서 의식의 끈을 붙잡던 박효신의 ‘야생화’. 스틸컷처럼 박제된 선율을 뒤로 하고 오늘도 ‘전투력 상승 플리’를 찾아 헤맨다. 탈옥에 성공한 건지 여전히 미스터리인 파피용처럼 나는 매일 디지털 생츄어리로의 탈주를 꿈꾼다.
오롯이 나를 위해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고요를 택한다. 노트북 화면에 반사된 아이의 얼굴을 이따금 확인하면서 나의 지금을 돌아보는 시간. 그 어떤 외부의 개입도 없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을 흔든다.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헤치며 나를 복기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바스러진 껍데기만 남았을지도. 처방전 속 이름 모를 알약을 밀어 넣으며 신경 세포를 누르는 데 익숙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도 나는 요령 없는 사람이나 구르고 터지면서 맷집만 자랐다. 글에 빚진 인생이라 죽도록 도망가고 싶었던 글쓰기가 나를 살렸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을 체감하며 ‘자 오늘의 똥통에 들어가 볼까?’ 다이빙을 준비한다. 빌런 플레이 리스트를 전투복 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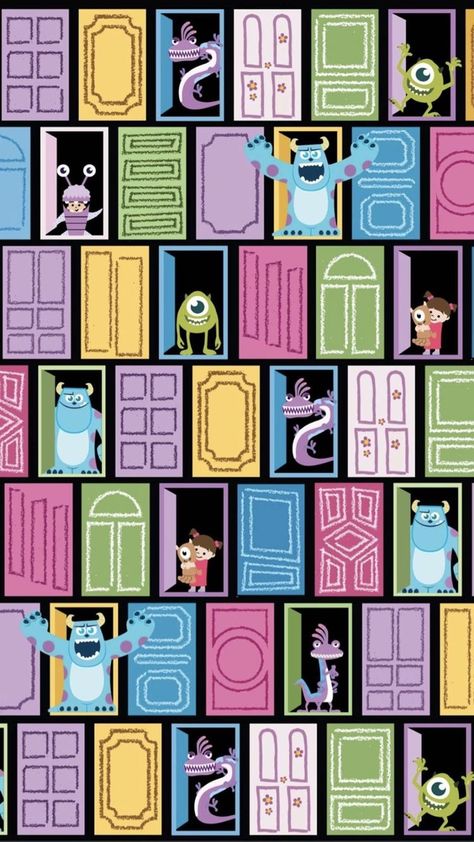
youme
너와 나, 합해서 우리.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링크복사
링크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