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의 공소시효

살면서
반복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교포세요?"였다. 대개 질문의 발원지는 아이 컨택이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 훗날 어느 면접 가이드북에서 답변 시 면접관의 미간을 보며 답하라는 문장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이 한국식 예법이군. 그 질문은 "눈을 왜 그렇게 똑바로 떠?"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꿋꿋이 나는 직접 화법으로 상대를 응시했다. 항상 상대의
눈을 보며 말하는 게 에티켓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서.
유망학과라는
이유로 휩쓸리듯 전공을 택한 결과. 이십 대 초반의 나는 말 그대로 표류 상태였다. 피 색깔도 파랄 것처럼 냉랭한 기류의 전공 수업에서 가르친 건 경쟁과 쟁취뿐.
나는 성공 방정식 게임에 넌덜머리가 나 공강 시간이면 영화 동아리방에 콕 박혀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문과 교수실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 전체 학부 대상의 교양 과목 수강생
중 하나일 뿐인, 사전 약속도 없이 밀고 들어온 낯선 얼굴을 교수님은 반갑게 맞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가 다기에 차를 덖고 과일을
깎으며 "그래 학교생활은 어떠니?" 따뜻하게
묻자 나는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다.
신학기 시간표를 짤 때면 그녀의 수업을 일 순위로 배치했다. 영문과 개강 총회에 왜 안 왔냐는 친구들에게 "나 경영학관데?"하고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들은 식스센스에 버금가는 역대급 반전이라며 "소름!"을 외쳤다. 나는 그렇게 그녀를 추앙하는 숱한 무리 중 하나이자 비공식 팬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사어가 된 고대 영어를 배우고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셰익스피어의 시 낭송과 연극에 참여했다. 지극히 실용적인 전공과목들은 그저 심드렁하기만 했다.
방학이 끝나면 교수님의 모험기를 기다렸다. 그리스 신전으로 향하는 지중해 바다 한복판. 어딘가 부족한 가이드 대신 마이크를 잡고 신화의 의미와 기원을 유려하게 설명한 다음 한 곡조 멋드러지게 뽑았노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우리는 너나없이 환호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업>의 주인공 할아버지와 똑 닮은 우리의 할머니 교수님은 홀홀단신 세계를 누비며 그녀만의 신화를 써내려갔다. 역촌동 할아버지 서재에 전리품처럼 쌓여 있던 낯선 나라의 기념품을 단서로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추적해 나가던 나는 교수님이 할아버지도 모르는 이복 동생은 아닐까 의심을 품었다.
섬광처럼
번뜩이거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처럼 은은하거나.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의 눈동자에는 전류가 흐른다. 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감동의 모든 스펙트럼을 표출하는 창이다. 안광에는
세상을 보는 힘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어떤 풍파에도 형형한 빛을 내뿜는 눈에는 한 가지 조항이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의, 열린 결말로 가는 출사표. 불순물 없는 믿음. 그리고 맛보았다. 오직 눈으로만 전이되는 희망이라는 바이러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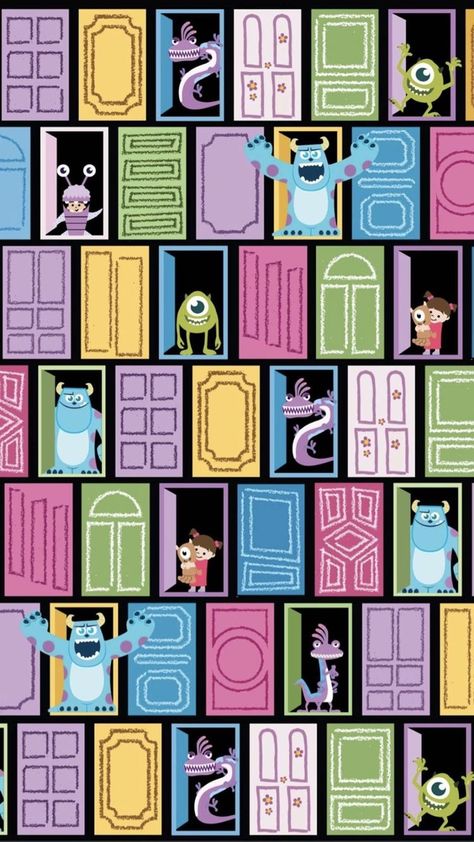
youme
너와 나, 합해서 우리.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링크복사
링크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