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의 효과
2017년 3월 4일 동아사이언스에 실린 윤병무 시인의 글에 따르면 ‘눈썰미’와 ‘안목’은 관찰력에서 기인하며, 이는 다시 “마음의 작동으로 동작”한다. 어딘가 나의 마음이 끌리는 곳에 관심과 눈길이 가고, 그러한 관찰의 결과가 사물을 묘사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밝혀내는 데에서 재미를 느낀다. 그러나 그 밖의 곳에서는 관찰력이 매우 부족하다.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니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도 다양하다.
내가 몸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무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춤을 추든 수영을 배우든, 그 속도가 마음 같지 않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에 대해 깊이 탐구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줄 모르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몇 년 전, 우리 동네의 자랑인 세계평화의 숲에서 식물화 그리기 수업을 들으며 관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평생 ‘나는 그림을 못 그려’라고 생각해 왔다. (사실이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동생과 나는 영 재능이 없다는 게 우리 가족의 미스터리다. 타고난 능력이 없다는 말로만 이 신비를 풀기는 어렵다.
뛰어난 화가는 고사하고 대상의 형태와 색을 엉뚱하게 표현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관찰력과 연습 혹은 시도가 부족한 탓이다. 내 일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인데, 그럼에도 나무를 떠올려 그려보자면 선은 영문모를 곳에 가서 멈춘다. 그러나 식물화 그리기 수업을 들으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형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나뭇잎의 톱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꽃잎은 몇 개인지,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어떤 모양으로 갈라져 나오는지.

(바다보다 빵빵이 좋은 19개월 아기와 그의 아버지)
어디 그림만 그러할까, 사람도 그렇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관계를 맺으면 그 이상의 기쁨이 돌아온다. 유려한 문장이 아니라 표정과 몸짓, 단어 몇 개로 자신을 표현하는 아기를 대하면 더욱 그러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지 세세히 살피다 보면 이내 웃음이 터진다.
다른 존재 덕분에 내 일상이 변화하고 내 경험이 확장된다.
시간은, 마음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도리
N잡러
세 명이 한 가족, 섬에 살아요.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걷기를 가장 좋아해요. 때로는 영화를, 소설을, 친구의 이야기를 걸어요.
-

- 햇빛
- 몽환
- 숲속쉼터 #멋진숙소
- 가을 하늘
- 인생
- 소망
자작나무숲의 환희
영양 죽파리 자작니무숲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다가 드디어 시간을 내어 출발했다. 포항영덕고속도로 개통 덕분에 시간이 단축되어 기분좋게 도착하였다. 죽파리로 들어가는 동네 길이 좁아서 많이 알려지면 전세버스들도 들어올텐데 운전이 불편할 듯도 싶었다. 입구에 자작나무숲과 영양 관…
2025. 11. 23by기쁜빛 -

- 마음
- 방향성
- 인생
- 자신
- 응원
응원이 필요한 날
검색창에 '구름 레이더'를 적고 엔터 키를 눌렀다. 30분 단위로 시간을 설정하고 재생 버튼을 클릭하니, 수도권 두 세 곳에서 구름이 피어올라 순식간에 덩어리를 만들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이동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올라갔는데, 근대적 방식의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이래 …
2025. 07. 09by한도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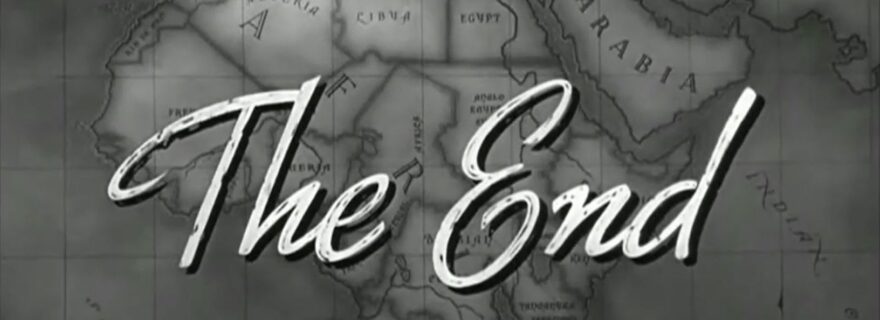
- 생각
- 오늘은내얘기
- 인생
- 엔딩크레딧
- 영화
내 인생의 엔딩 크레디트
한때 어떠한 무리의 관객은 엔딩 크레디트가 모두 올라갈 때까지 상영관 내 조명을 꺼두느냐, 본편 영상이 끝나자마자 환하게 불을 켜 관객이 퇴장하도록 하느냐를 기준으로 그 극장의 '격'을 따졌다. 소위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라면 관객이 영화의 여운을 즐기고, 영화를 만든 모든 사람의 정…
2025. 05. 12by한도리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링크복사
링크복사